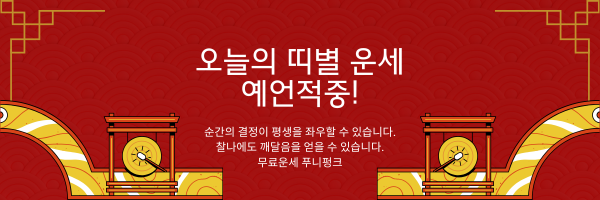[6·25 전사자 얼굴 복원 사업 – 유족에게 '다시 만난 얼굴'을 선물하다]
6·25전쟁이 일어난 지 올해로 75년. 대부분의 참전 유공자들이 고령에 접어든 지금, 전장을 누비다 이름도 얼굴도 남기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바로 이들의 얼굴을 복원해주는 감동적인 국가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실종된 호국영웅에게 이름과 얼굴을 되찾아 주는 이번 국방부의 ‘6·25 전사자 얼굴 복원 프로젝트’는 유족에게는 오랜 기다림의 끝이자, 국가적으로는 숭고한 예우의 새로운 방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과 유족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얼굴이 없는 안장식, 이제는 안녕!
전사자 유해는 매년 1천 구 이상 발굴되지만, 신원이 확인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생전 사진이 없는 경우가 많아 ‘영정 없는’ 안장식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손잡고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두개골을 3D 스캔하고, 법의학적 피부두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전 얼굴을 복원하고 영정을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첫 주인공 송영환 일병의 복원 얼굴을 본 그의 딸은 “어릴 적 봤던 사진과 정말 닮았다”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 유해 복원의 핵심, ‘유족 유전자’
신원 확인의 열쇠는 결국 DNA입니다. 국유단은 지금까지 약 1만 1,469구의 유해를 발굴했지만, 신원을 확인한 경우는 단 256구에 불과합니다. 유해가 오래 묻혀 DNA가 심하게 손상된 데다, 유가족 유전자 정보가 확보되지 않으면 매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유단은 현재 최대 8촌까지 유전자 시료를 받아 분석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는 6촌 이내에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 얼굴 복원은 어떻게 진행되나?
복원의 시작은 두개골. 형태가 온전하고 특징이 뚜렷한 유해를 선정한 뒤, CT 촬영과 3D 스캔을 통해 두개골의 입체적 구조를 분석합니다. 이후 한국인의 평균 피부 두께 및 특징 데이터를 바탕으로 눈매와 얼굴형을 구현합니다. 송 일병의 경우 왼쪽 광대뼈가 없었지만, 오른쪽 구조를 대칭해 완성했습니다. 군복, 철모 등도 6·25 전쟁 당시의 복장을 그대로 재현해 고증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 유가족이라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가족 중 실종된 참전용사가 있다면, 국유단 유가족관리과와 연락해 유전자 시료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을 사칭한 전화 사기 사례도 있어 조심해야 하며, 유전자 채취는 철저한 확인 절차를 거쳐 무료로 진행됩니다. 시료는 채취 후 국과수를 통해 분석돼 해당 유해와 일치 여부를 판별합니다.
📢 기억을 실천하는 방법
- 혹시 6·25 전쟁 당시 실종된 가족이나 친척이 있다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나 ☎ 대표전화(국유단)로 확인하고 DNA 시료 채취에 참여하세요.
- 주변 어르신들께도 해당 정보를 알려 주세요. 특히 고령 유족의 증언과 참여는 신원 확인의 결정적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 SNS나 커뮤니티에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공유해 더 많은 유족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하나의 호국보훈입니다.
☑️ 요약하자면
- 얼굴 복원 사업은 얼굴 없이 떠나는 전사자들의 마지막 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국가 예우입니다.
- 기술은 진보했지만, 결정적인 건 유족의 참여입니다.
- 나와 상관없어 보일 수 있지만, 누군가의 아버지, 형제일 수 있는 호국영웅에게 이름을 찾아주는 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입니다.
국가는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억하고 연결하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