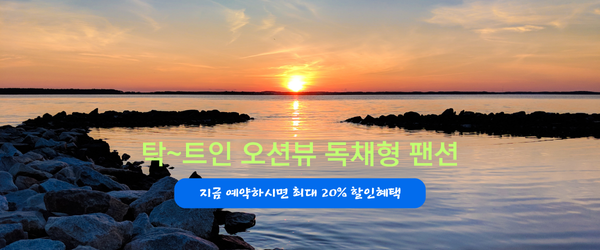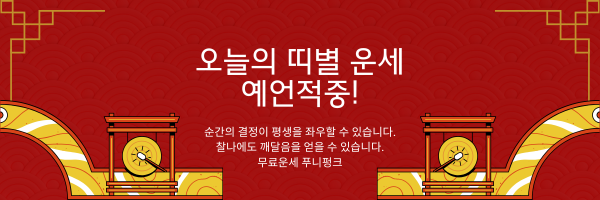산과 바다 너머의 감정, 서귀포에서 시작되는 감각의 회복
제주 남단, 바람이 언제나 먼저 도착하는 도시. 서귀포는 그렇게, 계절보다 먼저 내 마음에 온다. 매끈한 리조트와 여유로운 카페가 나란히 놓인 해안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이 도시를 안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된다. 이곳은 바다를 향해 열린 언덕이자, 바다를 등지고 솟아오른 오름의 고장이며, 사람과 자연이 엇갈리지 않고 나란히 걷는 공간이다.
서귀포는 제주공항에서 차로 1시간 남짓. 짧은 거리지만 마음까지 닿기 위해선 조금의 느림이 필요하다. 해안 도로를 잇는 버스 창밖의 풍경은 생각을 뒤척이게 하고, 시내버스터미널에서 만난 여행자는 이상하리만치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본다. 그 무언의 시선마저도 서귀포와 어울린다.
빛보다 느린 아침, 섶섬 너머의 감정이 깃든 도시
서귀포의 아침은 도시답지 않다. 섶섬 너머로 비치는 햇빛은 느리게 퍼져 사람들이 깨어 있는 풍경보다 조금 뒤늦게 도착한다. 정방동 골목을 천천히 걷다 보면 세월과 공존하는 창틀, 기왓장 위로 자란 이끼, 그리고 그 위를 덮은 제주 오후의 습기가 있다.
이른 아침, 정방폭포를 바라보는 해안 산책길에 서면 하루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폭포에서 내리는 소리는 물의 언어로 속삭이는 위로 같다. 시냇물은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한다.
오후의 햇살과 바람, 골목과 마주친 감성의 간격
서귀포의 골목마다 담긴 이야기는 작지만 분명하게 다가온다. 중앙로와 이중섭거리 사이엔 지역의 숨결이 아직 고스란히 머물러 있는 오래된 재봉소와 수선집, 그리고 그 옆에서 막 굽혀 올라오는 커피향을 내는 카페들이 공존한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섞이기보단 맞물리는 곳. 그것 하나만으로도 서귀포는 스스로의 시간대를 가지고 있다.
시간이 멈추듯 흐르는 감귤 밭 사이, 감귤꽃 만개하는 4월의 향기로운 바람은 서귀포에 처음 오는 여행자의 폐를 환기시킨다. 그때문일까. 이 도시에서는 누구나 쉽게 감정의 속도를 천천히 늦추게 된다. 일상을 달리던 페달을 살며시 멈추고, 바람을 기다리는 여유가 생긴다.
비 오는 날, 창밖의 기행과 방 안의 풍경들
봄과 여름 사이, 장마가 스며든 오후의 서귀포는 묘하게 사람을 안으로 끌어당긴다. 빗소리는 마치 오래된 레코드처럼 일정한 채도와 결을 가지고 들려온다. 남국로의 조용한 가정식 밥집에서 만난 30년차 사장님은 "이 비, 고사리 자라게 하는 비다"라고 말했고, 그날의 빗소리는 특별히 식욕을 북돋우었다.
카페 ‘수월당’의 2층 창가에서는 비가 창을 긁고, 그 넘어 감귤창고의 녹슨 지붕이 반짝이는 빛을 담는다. 나무 테이블 위로 떨어진 물방울 자국 하나조차 시처럼 느껴지는 날. 이 도시는 계절과 함께 우리의 감각을 조용히 일깨운다.
밤의 질감과 발길의 끝, 서귀포에서 드러나는 진짜 여행의 얼굴
해가 지고 나면 서귀포는 더이상 관광지가 아니다. 도시와 자연이 서로의 생존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곳, 한적한 해안절벽길을 걷다 보면 파도소리 속에서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들이 떠오른다.
"내가 마지막으로 나를 들여다봤던 시간은 언제였을까?"
서귀포의 밤은 어떤 대답보다, 질문 자체가 중요한 시간임을 일깨운다.
지금 우리가 진짜 원하는 여행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화려한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도시가 우리 안의 어떤 기억을 여는가다.
서귀포는 머무르는 찰나가 아닌 삶의 속도를 바꾸는 임계점 같은 도시. 특별한 경험은 어느 카페에서의 커피 한 잔, 혹은 폭포 아래를 지나던 순간일 수도 있다.
무언가를 채우기보다는 덜어내기 위한 여정.
조용히 예약창을 열고 ‘서귀포’ 세 글자를 쳐보는 그 순간, 당신의 일상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한낮의 햇살이 아닌, 아침이 막 깨어날 무렵 그 골목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감정들이 있다.
‘서귀포 어디까지 가봤니?’라는 질문은 어쩌면, '당신은 얼마나 당신과 가까워졌느냐’는 물음인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