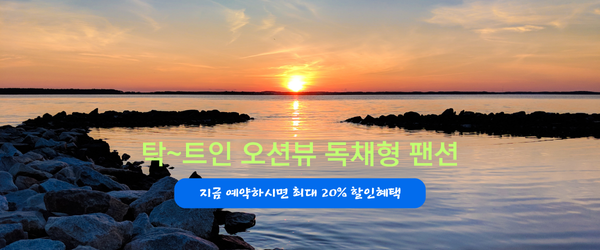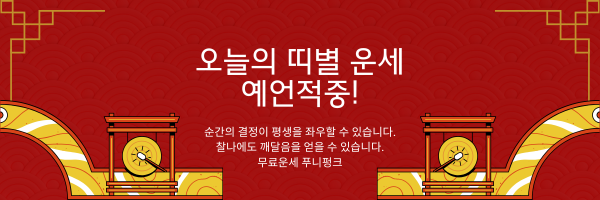서귀포는 늘 같은 자리에 있지만, 계절이 지나갈 때마다 표정이 달라진다. 봄이면 향긋함이 앞장서고, 여름엔 햇살이 노래하며, 가을은 바람에 사유를 태우고, 겨울엔 감귤빛 한가득 찬 미소를 전한다. 여행자는 그 계절의 공기를 받으며 조금씩 달라진다. 이곳에서 보내는 하루는 단지 휴식 그 이상이 된다. 자기를 들여다보고, 익숙한 일상 바깥에서 감각의 다른 면을 꺼내보게 되는 시간. 서귀포는 그렇게 사계절 내내 여행자의 마음을 새롭게 쓴다.
봄날의 유채꽃 바람, 안덕면 골목을 걷다
바람이 아직 차가울 때, 서귀포의 들판은 노랗게 피어난다. 3월의 안덕면 창천리, 초록보다 먼저 도착한 유채꽃은 들판을 가리지 않고 퍼진다. 꽃을 보려는 발길이 많지만, 마을 사람들만 아는 비탈진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면 조용한 꽃냄새가 코끝에 맴돈다. 바람이 스치며 꽃잎을 흔들 때 나는 그 소리는 마치 봄이 귓가에 속삭이는 것만 같다.
그 길 끝에 자리한 ‘봄다방’은 작은 흙집을 개조해 만든 로컬 카페. 주인 할머니는 원래 감귤농사를 지었고, 현재는 노란 꽃 시럽을 직접 담가 티로 내준다. 약간 씁쓸하고, 처음 마셔보는 맛. 서귀포의 봄은 단순히 꽃을 보는 풍경이 아니라, 회복의 매개가 된다.

여름 오후, 중문 바다와 파도 사이의 느린 하루
뜨거운 볕 아래 중문해수욕장에 이르면 바다는 짙은 남색으로 펼쳐진다. 모래는 의외로 부드럽고, 물은 발끝에서부터 몸을 설득한다. 여름의 서귀포는 소음으로부터 멀어진다. 비치 파라솔도, 사람들의 목소리도 잔잔하게 깔리고, 바람에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배경이 된다.
소정방폭포로 가는 길, 바다를 껴안은 절벽 위에 숨겨진 서점 ‘파도서가’가 있다. 이곳의 운영자는 서울에서 출판 일을 하다 서귀포로 이주해 바닷가에 책방을 열었다. 조용히 책을 들추고 해가 기울 때까지 파도 소리에 귀를 빌려주는 그 시간. 무언가를 소유하지 않아도 충분히 감동적인 오후가 있다. 여행자의 내면도 그렇게 채워진다.
억새 위를 걷는 10월, 군산오름에서의 사색
가을의 서귀포는 말없이 말을 건다. 군산오름은 서귀포 시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지만, 정상에 오르면 제주 서남부의 바다, 오름, 귤밭, 마을의 지붕들까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억새는 10월이면 은빛으로 변하고, 바람 따라 잎을 접었다 펼쳤다 한다.
가을 바다는 푸르지 않고, 오히려 바래진 회색빛.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계절이다. 정상 근처 작은 평상에 앉아 바라보는 억새 물결은 마치 속마음을 읽어주는 듯하다. 군산오름 초입에 ‘바람정미소’라는 공방 겸 찻집이 있다. 미숫가루에 지역 귤청을 섞어주는 한 잔에 잠시 멈춰 선다. 그곳에서 만난 청년 작가는 불어나는 억새처럼 계절이 감정을 튼튼하게 만든다고 했다. 여행자는 이 말을 가슴 깊이 안고 오름을 내려온다.

겨울 감귤 향 따라 골목을 걷는 어느 비 오는 날
12월의 서귀포는 가장 강렬한 색을 품는다. 감귤빛이다. 늘 비슷한 겨울을 보내는 도시 사람들에게 서귀포의 겨울은 잔잔히 충격을 준다. 촘촘히 열린 귤, 농장 담 넘어서 손 내밀 듯 다가온다. 서귀포 중앙로 시장 근처 골목의 오래된 단층 주택 사이, 작은 귤 창고를 개조한 ‘귤 그릇’ 카페에 들렀다. 귤잼이 발라진 토스트와 겨울블렌드 커피가 있다.
재즈가 흐르고, 비는 지붕을 두드린다. 창밖으로는 귤 담은 유리병들 사이로 지나가는 아이들이 고개를 돌려 미소를 건넨다. 겨울의 서귀포는 익어가는 삶의 풍경이다. 단순히 귤을 먹는 시간이 아니다. 이 계절을 살아냈다는 걸 확인받는 정서의 풍경이다.
우리의 여행은 어쩌면 멀리서 오지 않는다. 조용히 계절을 따라 떠나고, 느리게 걸으며, 지역이 품은 시간 안에 자신을 놓아두는 것.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 계절쯤은 비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곳으로 발걸음을 내딛어도 좋다. 당신만의 계절은 서귀포 어딘가에서 여전히 익어가고 있다. 지금, 봄의 유채꽃 길을 검색하거나, 겨울의 감귤 농장을 예약하거나, 여름의 해수욕장 옆 책방을 지도에 찍는 것으로 시작해보자. 그 여정은 단지 여행이 아닌, 삶의 향을 되찾는 미세한 전환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