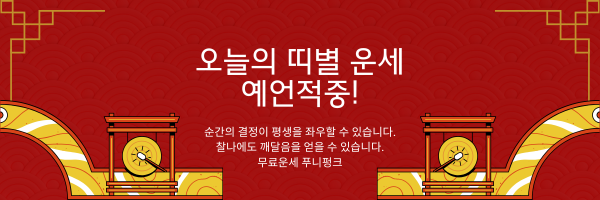신화와 인터랙티브 예술의 융합 실험 –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이 비추는 현대 문화의 지향점
전통은 과거의 유물일까, 아니면 지금도 유효한 경험의 틀이 될 수 있을까.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은 이 질문에 기술과 예술, 지역문화가 어우러진 흥미로운 답변을 제시한다.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서귀포항 일대에서 개최되는 이 복합형 문화축제는 단순한 유산의 ‘재현’을 넘어, 신화 속 인물과 관광객이 실시간으로 교감하는 참여형 퍼포먼스를 중심에 둔다. 특히 모바일 게임과 연결된 연극 ‘신과 함께 야행_강림차사편’은 디지털 서사의 실험적 가능성을 예고하며, 현대 예술이 어떻게 전통을 해체하고 재조합하는가를 보여준다.
한국형 인터랙티브 연극의 실험 – ‘강림차사편’이라는 놀이적 계승
‘강림차사’는 고대 도교와 불교 세계관이 혼합된 저승신화의 중심 인물이며, 인문지리적 상상력이 투영된 제주 서사 체계의 상징적 코드다. 이번 축제 프로그램은 이를 현대화한 디지털 내러티브로 확장하며, 참여자들은 위치를 기반으로 한 연극형 게임에 직접 ‘인턴 차사’로 투입된다. 공연은 거리 퍼포먼스 형식으로 진행되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현장 QR코드로 접근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사에 상호작용한다. 이는 니콜라 부리오의 ‘관객의 참여가 곧 작품의 완성’이라는 관계미학 이론을 실감하게 하는 사례다.
기억과 공간을 엮는 8야 프로그램 – 집단적 상상력의 갱신
이번 야행 축제는 무용, 미디어 아트, 내한 콘서트, 신화 뮤지컬, 패션쇼까지 포함하는 복합 예술 플랫폼이다. 특히 ‘설문대 할망’과 ‘영등 할망’ 등 제주의 여성 신화를 중심 인물로 재조명한 무용 공연은 젠더 신화 읽기의 현대적 시도다. 바다 위에 구현된 홀로그램 ‘서천꽃밭’이나 야화(夜畵) 프로그램의 포구 설치미술은 공간을 기억하고 신화의 풍경을 시각적으로 복원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이는 장소 특정성(Site-specificity) 이론이 시대성과 접목된 방식으로, 로잘린드 크라우스의 “예술은 더 이상 사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경험 그 자체를 매개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다양성과 다세대 연계 – 로컬에서 나타나는 문화 민주주의의 흐름
이번 행사에는 시니어 모델이 참여하는 패션쇼, 생활음악협회 주민 공연팀의 버스킹, 음식과 전통 공예를 엮은 플리마켓 등 다세대, 다분야 시민 문화의 공동구현이 눈에 띈다. 특히 ‘신들의 객주’라는 테마로 꾸며진 푸드트럭 거리와 ‘신들의 선물’이라는 플리마켓은 축제의 경계를 예술에서 일상으로 확장시킨다. 이는 클레어 비숍이 말한 “예술의 사회적 전환(social turn)”을 로컬문화 정책으로 실천한 사례다. 예술을 ‘소비하는 대상’이 아닌 ‘공동체의 축제로 매개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문해력과 전통문화의 재서사 작업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은 특히 MZ세대를 ‘문화적 실험 파트너’로 상정하고 있다. 애플·구글 앱스토어 기반 인터랙티브 콘텐츠는 현대 젊은 층의 디지털 친화적 감각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전통 컨텐츠에 대한 새로운 문맥을 제공한다. 이는 하버드대의 헨리 젠킨스가 언급한 컨버전스 컬처(Convergence Culture), 즉 미디어 간의 경계 해체 및 사용자 주도 서사 생산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제주신화의 경전성이 오늘날 오픈 월드 플랫폼 서사로 재구성되는 이 장면은, 예술이 어떻게 이야기의 전달 방식을 동시대의 언어로 번역하는가를 보여준다.
예술, 공공, 디지털 그리고 전통이 만나는 접점
서귀포야행은 전통적 서사(신화)와 현대 기법(게임, 연극, 홀로그램, 모바일)을 엮어 미래형 로컬축제의 새로운 비전을 제안한다. 이 접점은 동시대 예술이 ‘경계 장르’를 기반으로 지역성과 문화 향유를 융합하는 방식의 대표 사례이며, 무엇보다 참여자 스스로가 이야기를 소비자에서 큐레이터로 전환해가는 주체적 경험을 제공한다. 이는 예술 향유의 민주주의를 넘어 예술적 주체화의 가능성을 드러낸다.
이 현상은 우리 시대의 어떤 문화적 질문을 던질까? 전통과 기술이 마주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새롭게 상상하고 있는가? 문화 향유자라면 이제 단순 관람을 넘어, 그 이야기 안에 ‘들어가고’, ‘플레이하며’, ‘재해석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 축제를 둘러싼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먼저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과 함께 야행’ 참여 신청을 해보자. 참여자는 단순한 관람객이 아니라 이야기의 구성원이다. 또한 제주 신화에 관한 서적이나 논문(예: 박시인『제주 신화와 여성신의 문화기원』 등)을 병행해 읽으면 해석의 깊이가 더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SNS 해시태그를 통해 경험을 공유하고, 제주가 아닌 자신의 지역에서도 유사한 문화축제를 탐색하고 제안해보는 것도 하나의 ‘일상 속 예술 실천’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