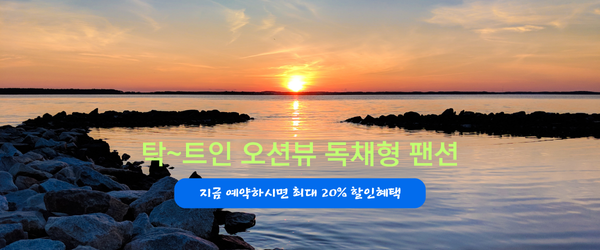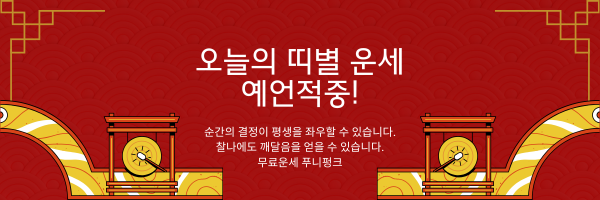‘착한 남자’ 신화의 해체와 감정 권력 재구성 – 관계의 감정 정치학을 다시 생각하다
오늘날 문화 속 로맨스와 젠더 서사는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 특히 ‘착한 남자(nice guy)’라는 오래된 연애 코드가 이제 더 이상 ‘낭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들은 헌신적으로 보이지만 자기애적이며, 이해심 많은 듯하지만 본질적으로 감정을 통제한다. 이러한 회색지대의 정체는 지금, 전 지구적 문화 대화장 안에서 조명을 받고 있다. 몰리 버퍼드의 칼럼처럼 ‘착하다’는 명목 하에 타인의 감정을 도구화하거나 자신을 이상화하며 감정적 보상을 요구하는 존재에 대한 비판은, 단순한 연애 문제를 넘어 사회 구조와 젠더 권력의 본질을 되묻는 강력한 문화적 질문이다. 이 글은 ‘착한 남자’ 서사가 어떻게 정서적 노동의 불균형과 심리적 권력 구조를 정당화하는지 분석하며, 나아가 포스트-페미니즘 시대의 관계 윤리를 모색한다.
감정 노동의 비가시화와 ‘착한 남자’의 교섭 전략
‘나는 나쁘지 않다’는 주장, 그것이야말로 가장 교묘한 권력이다. 착한 남자는 자기 호의를 일방적인 투자로 간주하며, 그에 대한 정서적 보상을 당연시한다. 이는 감정을 자발적 흐름이 아닌 교환 수단으로 간주하는 구조적 폭력이다. 사회학자 에바 일루즈는 『사랑은 왜 아픈가』에서 이 문제를 예견한 바 있다. 그녀는 감정이 더 이상 자유롭게 표현되고 나눠지는 개별 행위가 아니며, 사회가 요구하는 특정 속성(특히 여성성)으로 상품화되고 착취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고 분석했다. 착한 남자의 논리는 감정 노동의 ‘투명성’을 무화시키며, 자신이 요구하는 감정만 보편화한다.
젠더 감정 표현의 비대칭성과 '예민함'에 대한 사회적 처벌
남성의 감정은 진실하고 솔직하며 사회적 포용을 받을 가치가 있지만, 여성의 감정은 지나치고 과잉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이중 규범은 단지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다. 사회는 누가 주체가 되고, 누가 반응해야 하는지를 미디어와 제도, 언어를 통해 학습시킨다. 감정은 비가시적 자원일지라도, 젠더 구조 안에서 산업화되고 계량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불균형은 심각하게 정치적이다. 심리학자 질레트 조던은 “감정이란 개인의 내면이 아니라 사회적 질서의 한 구조”라고 말한 바 있으며, 이는 ‘예민하다, 참아라’는 말이 얼마나 쉽게 감정 권력을 전유하는지를 시사한다.
구원 서사와 미디어: 감정을 통해 정체성이 소모되는 여성 캐릭터들
우리는 스크린을 통해 ‘감정적 문제를 가진 남자’가 여성 캐릭터의 사랑과 이해를 통해 구원받는 서사를 익숙하게 경험해왔다. 그러나 이는 곧 여성 캐릭터의 자율성과 감정 노동을 침묵시키는 장치로 작동한다. 드라마 <멜로가 체질>이나 <나의 해방일지> 같은 작품은 이러한 구조를 은근히 비판하지만, 여전히 다수 대중 콘텐츠는 관계 안의 감정적 불균형에 대해 무관심하다. 누가 더 많이 듣고, 누가 더 많이 이해하며, 누가 더 많이 참는가에 대한 질문은 그 자체로 미디어의 윤리다.
‘기준’ 혹은 ‘보호’라는 이름을 입은 감정 통제
“나는 너를 위해서야”라는 말보다 더 효과적으로 통제를 정당화하는 언어는 없다. 버퍼드는 칼럼에서 착한 남자들이 자신의 통제욕을 ‘기준’, ‘안전’, ‘보호’와 같은 언어로 포장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감정이 규범, 즉 정치적 언어로 작동하는 지점이다. 문화비평가 로런스 그로스버그의 ‘감정의 정치학’ 논의에 따르면, 감정은 단지 표현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승인되는 행위다. 나이스 가이의 감정은 관계의 중심 규율로 작동하지만, 상대의 감정은 그저 ‘반응’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은 이미 감정 권력의 착취 구조다.
로맨스 코드의 진화와 새로운 친밀성의 가능성
이제 로맨스는 관계보다 구조를 묻는 시대로 돌입했다.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을 둘러싼 사회적 계약이다. 최근 젠더 감수성이 반영된 비이성애적 서사, 퀴어 친밀성, 혹은 비연애주의 문화들은 기존의 로맨틱 코드가 필요로 했던 감정 노동과 젠더 역할에서 해방되려는 시도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많은 청년층이 ‘감정적 안정’보다 ‘정체성 존중’을 관계의 핵심으로 여긴다고 응답했다. 이는 로맨스 문화의 탈서사화, 즉 ‘정책적 친밀성’의 시대가 왔음을 의미한다.
‘착한 남자’ 서사는 이제 시대의 이면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것은 연애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언어이며, 감정의 소비 방식이다. 이 글을 계기로 우리는 관계에서 작동하는 정서적 불균형, 특히 언어와 감정이 권력화되는 방식에 더욱 민감해져야 한다. 우리가 속한 친밀성의 공간은 누구의 감정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의 감정을 양보하고 있는가?
지금 이 문화 현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면, 관련된 로맨스 장르 드라마나 영화를 다시 보며 감정 구성의 문법을 분석해보자. 혹은 <사랑은 왜 아픈가>(에바 일루즈), <페미니즘의 도전>(정희진) 같은 비평서를 통해 감정과 권력의 구조를 탐구할 수 있다. 그리고 온라인 포럼이나 독서모임에서 자신이 겪은 관계 속의 감정 경계를 논의해보는 것도, 젠더 권력에 저항하는 중요한 문화 참여가 될 수 있다. 정서도 권력이다. 이제는 관계 속 감정의 언어를 다시 쓰는 일이, 사랑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해졌다.
#aimediacon #콘텐츠자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