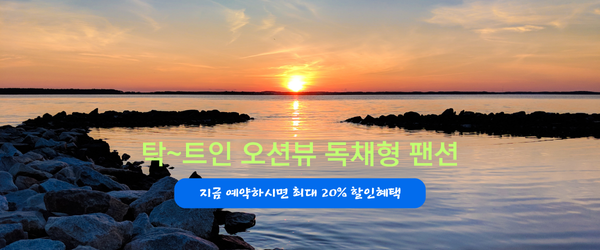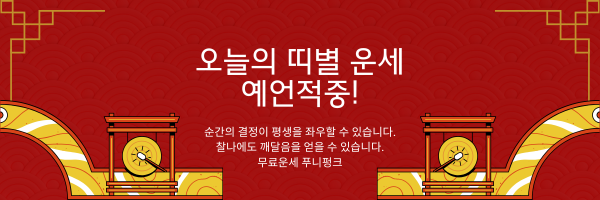재난 이후의 예술, 기억의 복원인가 새로 쓰기인가? – ‘When the Flames Went Out’가 보여주는 실재와 상실의 문화 정치학
자연재해가 사라진 것들에 대해 말한다면, 예술은 그 빈자리를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미국 캘리포니아 알타데나를 삼킨 2025년의 대형 화재—에이튼 화재 이후, 안토니 딘 트랜(Anthony Dinh Tran)은 이를 단지 생존의 기록이 아니라, 기억과 정체성, 공동체의 가능성에 대한 심층적인 질문으로 확장한다. 로스앤젤레스 리뷰 오브 북스에 발표된 그의 에세이 『When the Flames Went Out』는 재난 이후 삶을 단순한 복구가 아닌, 새로운 문화적 서사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조명한다. 예술은 어떻게 상실 이후를 말할 수 있는가? 이 비평적 텍스트는 감정적 애도의 언어를 넘어 ‘재건’이라는 행위의 정치적 · 미학적 층위를 파고든다.
재건은 과거로의 귀환이 아닌, 부재를 통과하는 윤리적 질문
트랜은 타버린 집터 위에 다시 설 때, ‘이전처럼’ 살기를 거부한다. 그는 “불타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재건이란 물리적 복원의 문제가 아니라 상실 이후 정체성의 재조정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임을 강조한다. 식탁의 그릇, 잿더미 속 자전거 부품, 서로 다른 기억의 파편들이 집합하는 이 공간은, 미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가 말한 ‘삶의 미시사’가 가장 밀도 있게 작동하는 지점이다. 이처럼 일상의 오브제를 통한 감각적 회복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과거를 재배열하는 문화적 제의다.
불공정한 피해, 재난 위의 인종적 불균형
이 화재는 단순한 자연적 재해가 아니다. 트랜은 유독 흑인 가정들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보험 약관, 지원금 분배, 지역 기반 시설 복구 등에서 드러나는 불균형은,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라는 개념을 다시 꺼내게 만든다. 1990년대 미국 도시학자 마이크 데이비스(Mike Davis)는 “로스앤젤레스의 재난은 예외가 아니라 일상”이라 말한 바 있다. 재난은 체계적 불평등을 극적으로 드러낼 뿐이며, 그 이후의 ‘재건’ 역시 동일한 구조 안에서 반복된다면, 결국 우리는 상실에서조차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된다.
기억의 파편화와 아카이브의 감정 정치학
트랜은 친구의 벽장에서 익숙한 물건을 발견하고 말없이 스마트폰 메모장에 기록을 남긴다. 감정의 격류를 객관화된 목록으로 전환하는 이 방식은, 1960~70년대 개념미술 흐름에서 나타난 기억의 형식화 전략과 유사하다. 감정을 표현하는 대신 감정을 구조화한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슬픔의 표출이 아니라 ‘기억의 정치’를 실천하는 예술적 사유다. 무엇을 목록에 넣고, 무엇을 빼는가—그 선택이 바로 문화적 기억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집"이라는 감정적 지형과 공동체의 재구성
트랜이 이야기하는 ‘재건’은 건축적 복원 이전에 공동체 감수성의 회복을 의미한다. 이는 리사 로우(Lisa Lowe)가 말한 ‘집의 감수성(home as affect)’과 밀접하게 통한다. 타일 한 장, 나무 기둥 하나를 보존하려는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시도는 단지 물리적 복원이 아니라, 공동체가 무엇에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감정을 통해 어떤 정체성을 이어가려는지에 관한 문화적 실천이다. 이때 재건은 ‘귀환’이 아니라 ‘다시 관계 맺기’의 시작이 된다.
예술은 어떻게 공공 기억을 설계하는가
『When the Flames Went Out』는 슬픔을 분해된 조각으로 응시하려는 시도이며, 동시에 예술이 개인의 상실을 어떻게 사회적 기억으로 확장시키는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한다. 이것은 단지 위문이나 공감의 언어로는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예술은 ‘잃어버림을 드러내는 일’을 통해 사회적 권력의 장(場)과 마주한다. 동시대 예술은 다시금 우리에게 묻는다. “기억은 누구에게 기록되고, 누구의 상실은 반복되며, 누구의 목소리는 사라지는가?”
이 에세이는 단순히 화재 이후의 복구기를 쓴 개인적 고백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시대가 자꾸 ‘과거로의 복귀’를 꿈꾸는 가운데, 돌아갈 수 없음의 지점에서 어떻게 새로운 삶의 구조를 예술적으로 구상할 수 있을지를 묻는 사회적 제안이다.
기억은 살아있는 기록이다. 이 글을 읽은 독자라면, 자신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조용히 기록해보는 것은 어떨까. 혹은 지역 공동체의 상실과 회복을 다룬 전시나 영상물, 독립 다큐멘터리를 통해 보다 넓은 감각의 좌표를 구성해보자.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문화는 결국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어떻게 함께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예술은, 그 선택의 무게를 살아가는 가장 구체적인 윤리이자, 상실을 공동의 목소리로 전환시키는 공공의 정치다.
#aimediacon #콘텐츠자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