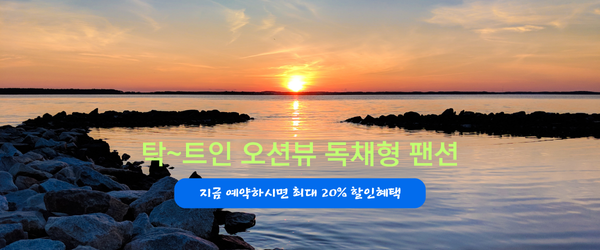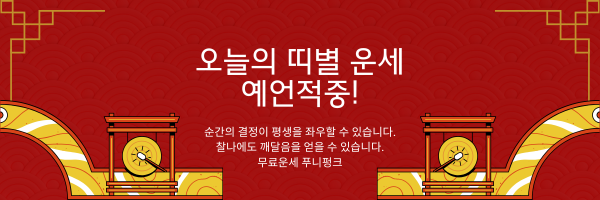죽음 그 이상의 건강 결정 – ‘녹색 장례’가 만드는 지속가능한 삶의 완성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웰다잉(well-dying)’은 더는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다. 향후 20년 내 약 30%가 65세 이상이 될 이 땅에서, 장례는 복지와 환경, 심리적 건강까지 아우르는 공공보건 의제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장례 문화는 고비용, 환경오염, 묘지 부족을 동반하며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 가운데 ‘녹색 장례(Green Burial)’는 삶의 마지막 순간마저 건강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간의 마지막 선택이 지구의 생태계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이제 ‘이념’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 글은 죽음 이후까지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시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가 외면해 왔던 전통 장례의 그림자
한국의 전통적인 장례 방식은 보통 시멘트 봉분, 금속관, 화학 방부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각종 중금속이 토양과 대기로 유출될 가능성을 높이며, 화장 한 건당 최대 수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도 있다. 사실 ScienceDirect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크립톤, 수은과 같은 유해 화학물질이 화장 과정에서 공기 중으로 방출되며 호흡기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고 경고한다.
장례 비용 또한 문제다. 통계적으로 한 건당 약 1,000만 원에 달하는 장례비용은 중산층 가계에도 큰 부담이다. 이런 경제적·건강적 부담은 단지 장례 당사자 개인이 아닌, 남겨진 유족과 사회 전체가 고스란히 지게 된다.
녹색 장례, 조용한 혁명의 시작
미국의 Green Burial Council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50곳에 불과하던 녹색 장례 허용 묘지는 2025년까지 497곳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램지 크리크’와 같은 사례들은 자연보전 단체 및 지역 공동체와 결합해 지속가능한 생태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녹색 장례는 화학약품을 일절 사용하지 않으며, 리넨·왕골·무염색 천처럼 자연분해 가능한 재료를 활용한다. 장례 절차는 생태계를 해치지 않으며, 유족이 직접 흙을 덮는 등의 과정을 통해 심리적 치유와 공동체 회복이라는 공공보건 효과도 갖는다.
특히 약 500만 원 수준의 비용은 전통 장례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며, 땅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 도시에서도 현실 가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는 죽은 뒤에도 지구에 책임이 있는가?
답은 분명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죽음 이후의 선택 또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영역”이라고 명시했다. 자율적인 사전 선택은 정신 건강과 심리적 안정에도 긍정적 기여를 한다. 또한, 환경을 해치지 않는 장례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 있는 행동이기도 하다.
죽음은 생명의 끝이 아닌, 생태계로의 환원이라는 순환의 과정이어야 한다. 도심 인구의 고령화와 묘지 공간의 부족, 날로 심화되는 기후위기를 고려한다면 녹색 장례는 단순한 이상이 아닌 절박한 현실의 대처법이다.
지금 당장 가능한 행동, 미래 건강 사회를 위한 선택
- 사망 이후의 장례 방식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가족에게 미리 알리고 생전 지시서에 반영해야 한다.
- 거주 지역의 수목장·자연장 가능 지역을 미리 조사하고 공공조례를 확인하자.
- 생분해성 장례용품과 자연장을 장려하는 제도를 보건복지부나 환경부에 시민 차원에서 촉구하자.
- 계절별 생태 조건을 고려하면 봄·여름이 분해에 적합하므로, 자연장 시기 선택에 참고가 된다.
- 평소 환경 장례 관련 공공 교육 프로그램이나 시민강연에 참여해 주변에 인식을 알리는 것도 의미 있는 행동이다.
작은 죽음의 선택이 건강한 삶을 확장시킨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남길 수 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상실과 애도의 과정조차 생태적 치유가 되는 사회, 그 출발점은 ‘녹색 장례’라는 실천이다.
이대로 20년 뒤 우리의 묘지는 건강할 수 있을까?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공공보건을 결정한다.